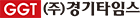멀쩡한 핸드폰을 N-세대들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이유하나로, 소위 ‘김 연아’ 폰인 타치폰으로 바꾼 필자 .. (핸폰만 바꾼다고 ‘쉰 세대’가 ‘신세대’로 되는 거냐는 비아냥을 얘들 엄마한테 듣는 건 당연지사)
전화에 대한 나름 추억을 더듬어 가며, 필자가 신조어로 만들어낸 “핸드폰 계수”에 관한 소고(小考)를 독자 여러분께 소개 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집전화(유선전화)’를 처음 접한 시기는 1967년(필자가 초등2년때)인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경기 평택)에서 유일하게 전화를 가지고 있던 집은 우리집이 아니고, 우리집에서
세를 준 옆방 집 이었습니다.
당시 옆방 집 아저씨는 ‘한국일보’ 평택주재 기자로서 전화가 꼭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 저는 두 부부(당시 신혼부부)의 눈치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따르릉’하고 전화벨이 울리기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윽고, 전화벨이 울리면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전화주인인 기자 아저씨를 제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하면, 예쁜 목소리의 교환원 누나가 “000 기자님 댁이죠?” 하고 말을 걸어오곤 했었죠.. 어찌나 신기했던지..
세월은 흘러가는 거겠죠.. 전화국에 백색전화(당시엔 양도가 가능한 전화를 부르는 명칭)를 청약한 지 몇 년 만인 1975년(필자가 고교1년 때).. 드디어 저희집도 전화(5-8663)가 설치되는 행운을 맞이함에, 중산층(?)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발음에서 착안한 “오! 팔뚝뚝심”(5-8663)으로 친구들에게 알려준 기억이 어제 일 같습니다.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요? 하필이면 한국통신(KT의 전신)에 입사한 필자는 80년대 말, 지금 핸폰과 비교하면 너무도 ‘무기’(심하게 말하면 ‘흉기’)같이 무식하게 몸체가 커다란 휴대폰(차에 설치해 쓰던 ‘카폰’ 포함)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을지전화국에서 독점으로 청약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렵고 신기하게 태동한 한국의 ‘이동통신’(011 과 012)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그의 사돈댁인 SK그룹으로 뛰뚱뛰뚱하며 유유히 걸어들어 가게 됩니다. (고속철 ‘떼제베’와 함께 6공 최대의 ‘정치스캔들 명예의 전당’에 헌정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됨)
무심한 시간이 마구 흘러 대궐처럼 큰 ‘정몽준’집 대문앞에 멈춰선 2003년 어느 날 밤..
정몽준의 일방적 ‘단일화 파기’(김흥국연출 정몽준주연)를 복원시키려 애원하다 지쳐, 발길을 돌리는 ‘노무현’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핸드폰’의 역사적인 ‘문자메시지’활동은 가히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우리의 불쌍한 ‘노무현’을 파란지붕 아래로 보내자는 .. 뭐 이런 류의 텍스트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필자가 만들어낸 “핸드폰 계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합니다.
초등학교 고 학년 때 배웠던 “엥겔계수”는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 화 한 값으로 정의 됩니다.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못사는 집 인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해, 가장 원초적인 먹고사는 일에만 신경쓸 수 밖에 없어서, ‘여타 다른 문화생활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인 셈’ 인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엥겔계수”가 “핸드폰 계수”로 마땅히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은 눈치가 빠르지 않은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닌가요?
불현듯 출현한 이 괴물딱지 같은 “핸폰”..
그 놈의 출현으로 그 나마 일주일에 한번이상 배달되어 오던 ‘프라이드 치킨’ 마져 뜸하게 되었지요.
이제, 필자는 결론을 도출하려 합니다.
핸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정치인들이여!
‘핸폰요금’을 대폭내리시어, 자식들 ‘핸폰요금’에 허리가 휘다 못해 불구가 되어버린 어여쁜 우리부모님(그대들에겐 ‘유권자’)들께 보답을 해주심이 어떨른지요?
‘핸폰요금’이 ‘집전화 요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날을
이 땅의 부모님들과 필자가 손꼽아 기다리려 합니다.
경기타임즈 객원 칼럼 김 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