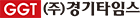그 옆엔 납작 집이 있었지.
해 뜨기 전 공장으로 스며들어,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양철 기운 납작 집에서
새벽출근을 기다렸지. 공장은 시커먼 폐수로 마을길을 넓히고,
건들건들 젊은이들 백구두도 만들었지. 두꺼비는 헌집을 주면 새 건물을 올렸어.
그 와중에 토종닭들은, 달걀이 부실하다고 낯선 닭들로 바뀌어 갔지.
습한 날에는 닭똥 냄새에선, 어쩐지 조미료 냄새가 났었다고.
마을 회관 옆 정자를 헐고 나무를 뽑아낼 때, 뿌리가 움켜쥐고 있던 건 흙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 무엇이었어. 실려 나가는 나무가 보이지 않자, 모두 가벼워진 걸 느꼈지.
왠지 술이 먹고 싶어졌어. 갑자기 가벼워져, 헐거워져 바람 부는 대로, 아무렇게나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 우린 바람이었어.
그 옆엔 납작 집이 있었지.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